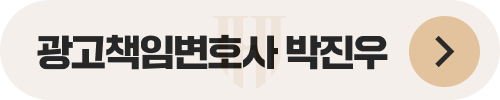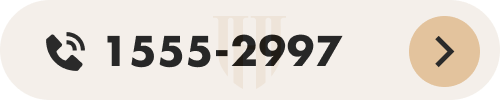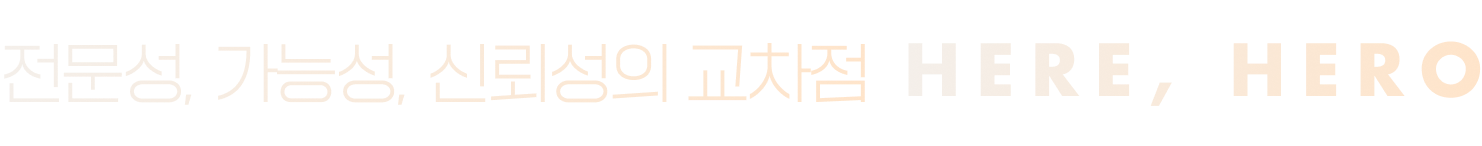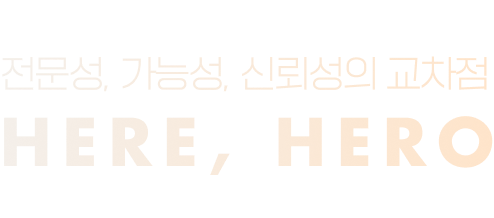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민사칼럼] 상가보증금반환 소송, 원상회복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가보증금반환 시점 아마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상회복이 덜 됐으니 반환해 줄 수 없다."
"상가 수리비를 공제하고 주겠다."
말도 안되는 이유, 어이없는 주장에 당황하고 계시겠지만 이는 명백한 임대인의 버티기 전략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반환청구부터 고려하셔야죠.
그 돈이 생활비일 수도, 다음 가게를 열 자금일 수도 있는데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생계와 직결된 문제. 지체할수록 손해만 커질 뿐인데요.
긴말 없이 3분 내 지금 선생님께서 필요한 정보만 짚어드릴 테니 조금만 투자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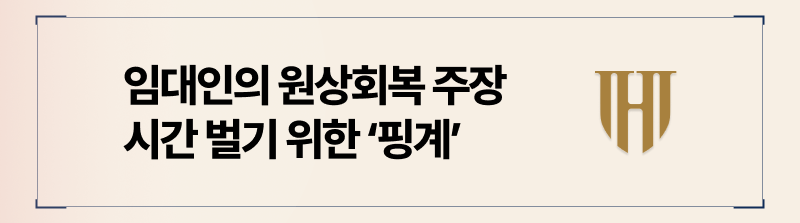
임대인의 핑계, 언제까지 들어줘야 할까 고민이시죠?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임대인이 해당 이유로 보증금을 안 주는 대부분 경우 돈이 없어서 입니다.
요즘 상가 공실이 워낙 많다 보니, 새 임차인을 못 구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 "원상회복이 덜 됐다."와 같은 핑계를 만들어서 버티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는 임대인 사정이고요, 본인이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원복 기준은 ‘최초 임차 당시 상태’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된 시설까지 임차인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래 사항만 제외하고 원복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 바닥이 낡았다? - 자연스러운 노후, 원상회복 불필요
2. 벽지가 빛바랬다? - 햇빛으로 인한 변화, 임차인 책임 아님
3. 작은 흠집? -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 원상회복 대상 아님
특히 양도양수로 가게를 이어받은 경우라면, 처음 양도인의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지금 가게 상태가 아니라, 원래 첫 임차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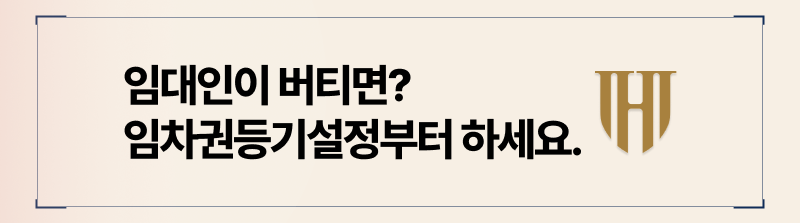
임대인이 버티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만약 끝까지 버티면서 "가게부터 비우라"고 한다면, 절대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가게를 비우면 점유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약해지는 것을 노린 것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임차권등기설정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 보호됩니다.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 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걸 막아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받아야 돈이 돌기 시작하는데,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으면 새 계약이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은 불가피 하다는 점 명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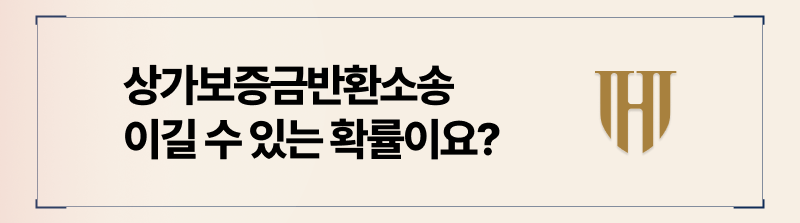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승산은 얼마나 될까요?
임차권등기까지 했는데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소송을 생각하면 부담부터 드시겠지만, 사실 이 소송은 임차인 쪽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법원은 원상회복 의무를 다한 임차인을 더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승소로 마무리될 경우.
✔️ 보증금 전액
✔️ 지연 이자 (계약 해지일 기준)
✔️ 변호사 비용 일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위 항목들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현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비용으로 인해 주저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수임료 500만 원 정도까지도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실 건가요?
임대인은 임차인보다 버티는 게 유리합니다.
생활이 달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좀 더 기다려보자" 하고 버티면, 결국 손해 보는 건 임차인 쪽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을 테니까요.
 방문상담
방문상담 채팅상담
채팅상담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 1555-2997
1555-2997